그들은 해마다 3-4개월을 물바다에 살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는 수많은 기억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환경도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그것도 카이로 북쪽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주민이 겪었던 경험은 어떠했을까?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바다처럼 넓어진 강과 범람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풍경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잠시 고대인이 그리고 있는 고대 이집트 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자.
물바다, 그야말로 바다였다
헤로도토스가 그리고 있는 나일강이 범람하여 온 땅이 물에 잠기는 풍경은 이러하였다. 그것은 큰 바다였고, 성은 바다위의 섬이 되었다,
나일 강이 범람하면 물 위에 보이는 것은 도시들뿐으로, 마치 에게 해 위에 떠 있는 도서 지방 같다. 즉 이집트 전역은 대해로 변하고, 도시들만이 물 위에 그 모습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물을 건널 때에도 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야 한가운데로 가게 된다. 예컨대 나우크라티스에서 멤피스로 거슬러올라갈 때에 실제 피라미드 옆을 지나 배가 나아간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항로는 아니고, 보통은 델타 정점에서 게르카소로스 시를 경유하여 간다. 바다에서 들어와 카노포스 도시를 경유하여 평야를 통해 나우크라티스로 항해하게 되면, 안틸라 및 ‘아르칸드로스의 도시’라 불리는 도시를 지나게 된다. - 헤로도토스, 박광순 역, <역사(상)>(eBook), 종합출판범우, 2022.

나일이 국토에 범람하면 물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은 도시들뿐으로, 그 모양은 에게해 위에 떠 있는 섬들과 같다. 즉, 이집트의 전토는 큰 바다로 변하고 도시들만이 물 위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을 건너는 것도 강줄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나우크라티스에서 멤피스로 거슬러 올라갈 때 배가 피라미드 옆을 지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항로가 아니고, 평소에는 델타의 정점에서 케르카소로스시를 거쳐 가야 한다. 바다에서 와서 카노포스시를 경유하여 평야를 지나 나우크라티스로 항행하려면 안틸라 및 ‘아르칸드로스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를 지난다. - 헤로도투스, 박현태 역, <헤로도토스 역사>(eBook),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2016.
고대 이집트인은 연례적으로 경험하던 풍경이 이것이다. 물에 잠긴 땅이 다시금 마른 땅이 되는 장면이다. 그 땅을 말려주던 그 바람을 알던 이들에게 창세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숨"은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에 대해 김동문은 이렇게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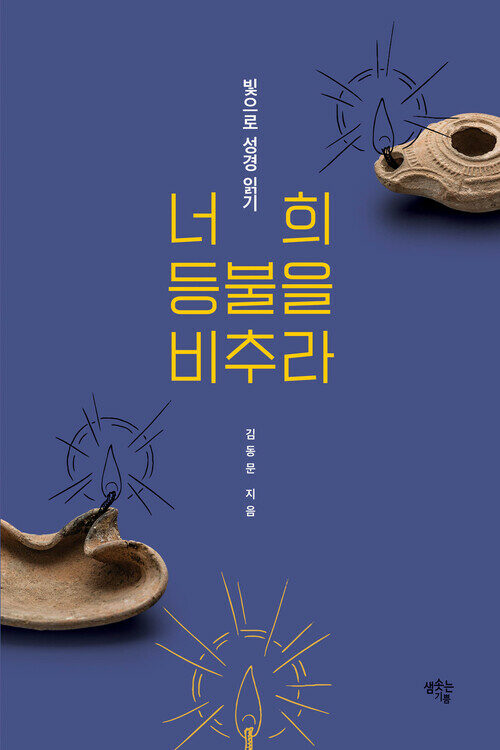
헤르모폴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원시 바다 눈(Nun, 원초적 대양)이 존재했다. 이집트인들은 이 눈을 숨김, 무한함, 방향 없음, 어둠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눈에서 태양신 아톰이 스스로 솟아나서 빛과 질서를 만들었다. 멤피스 창세 신화는 창조신 프타(Ptah)를 등장시킨다. 이 프타가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아톰을 지었다고도 주장한다. 독특한 것은 이 프타가 ‘말’로 아톰과 다른 신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집트의 원시 바다나 태양신 아톰 이전의 세계를 소개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창 1:2) 있었다는 창세기의 서술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지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라는 것이다. - 김동문, 너희 등불을 비추라, 샘솟는기쁨, 2023. 206
나일이 넘치다
사제들이 내게 이야기해 준 다음의 사항도 이 국토의 특질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들에 의하면 모이리스왕( - 보통 제12왕조의 아멘엠헤트 3세(Amenemhet) III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 시대에는 강의 수면이 최소한 8페키스(12피트)만 올라가도 멤피스 이하의 지역은 범람했다고 한다. 내가 이 사실을 사제들로부터 들은 것은 모이리스 사후 900년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현재는 최소한 15 내지 16페키스 정도 수면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강이 범람하지 않는다. - 헤로도토스, 박광순 역, <역사(상)>(eBook), 종합출판범우, 2022.
사제들이 나에게 말해 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이 국토의 특질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에 따르면 모이리스왕 시대에는 강물의 높이가 최소한도 8페키스(약 3.6m) 불어나면 이집트의 멤피스보다 아래 지역은 범람했다고 한다. 내가 사제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모이리스가 죽은 지 아직 9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에는 최소한도 15에서 16페키스(약 6.7~7m) 가량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강은 범람하지 않는다. - 헤로도투스, 박현태 역, <헤로도토스 역사>(eBook),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2016.
모이리스 왕 시절에는 8큐빗 (약 54센티미터) 높이의 나일강이 멤피스 아래 땅에 물을 공급했다. 그 후로 약 900년이 지난 지금, 범람해서 들판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15큐빗이 필요하다. - <헤로도토스의 이집트>, 헤로도토스 지음 / 위즈덤커넥트 AI 풀어씀 - 밀리의 서재
물바다가 된 북이집트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밤의 저녁노을은 땅과 하늘, 사람을 어떤 색감으로 물들였을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2)라는 서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에 눈길이 간다.
나일이 넘쳐 물로 뒤덮힌 땅이 다시금 마른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도 동물도 큰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땅이 빨리 마를수록 경작과 파종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 물에 잠긴 땅을 말리는 것이 바람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창세기 8:1)
그랬다. 다시금 바람이 분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땅을 가득 채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집트 땅의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일강이 적절한 수위까지 범람하지 않은 까닭이다. 출애굽의 무대가 나일 삼각주 지역이었던 것을 떠올려야 한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많이 개념적으로 다가갈지 모른다.
이 강의 성질에 관해서 나는 사제나 다른 누구로부터도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 나로서는 나일 강이 하지(夏至)를 기점으로 100일간에 걸쳐 수면이 높아져 범람하고 그 일수를 채우면 수위가 내려가 다시 하지가 될 때까지 겨울 전 기간에 걸쳐 수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꼭 그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이다. - 헤로도토스, 박광순 역, <역사(상)>(eBook), 종합출판범우, 2022.
이 강의 성질에 관해서 나는 사제로부터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나일이 하지(夏至)를 기준으로 해서 100일 동안에 걸쳐 물이 불어나 범람하고, 이 일수가 차면 수위가 내려가 다시 하지가 찾아올 때까지 겨울 동안에 감수된 채 그대로 있는 이유를 그들로부터 꼭 듣고 싶었다. - 헤로도투스, 박현태 역, <헤로도토스 역사>(eBook),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2016.

나일 강이 범람하여 평야가 대해(大海)로 변하면 이집트에서는 로토스라 부르고 있는 백합류가 무수히 물 속에서 자란다. - 헤로도토스, 박광순 역, <역사(상)>(eBook), 종합출판범우, 2022.
나일의 강물이 넘치고, 평야가 바다로 변하면 이집트에서 로토스라고 부르는 백합 종류가 물속에서 무수히 난다. - 헤로도투스, 박현태 역, <헤로도토스 역사>(eBook),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2016.
연꽃이 피어오르는 바다가 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인은 이같은 상황을 신화로 재창조했다. 고대 이집트인에게 연꽃은 남이집트의 상징이었다. 무엇보다도 태양(신)을 그려주고, 창조와 재생을 보여주는 존재였다. 연꽃이 새벽이면 물 위로 다시 솟아올라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헤로도투스의 이런 서술을 보면서, 고대 이집트인 창세기에 담겨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을까? 고대 이집트인에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익숙한 나일강의 범람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들렸을까? 어떤 점에서 고대 이잡트인은 해마다 크고 작은 노아의 홍수를 겪으며 살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