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희의 커피 이야기) 과테말라 게이샤를 마시며
작년 12월 초에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를 잠시 만나 서로의 일상에 대한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친구는 문득 너의 정체성은 뭐니라고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내 입에서는 나는 경계인이지라는 대답이 조건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왔다.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내내 경계인이란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사실 내 정체성을 경계인이라 정의한 것은 꽤나 오래전 일이지만 그 경계인이란 정체성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런 변화가운데 고정되지 못하고 흐르는 세월 속에 그저 그렇게 부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서경식 선생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어쩌다 내 손에 들어왔는지 기억 없는 나의 서양미술 순례를 꺼내 들고는 에필로그를 펼쳤다. 거기엔 외젠느 뷔르낭이란 작가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흑백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있었다.
“이 사나이들은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쫓기고 있는가? 고향을 쫓겨난 난민인가? 혹은 괴로운 여행을 계속하는 순례자인가? 곰곰이 바라보고 있노라니, 아아, 내가 지금 꼭 이런 꼴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다.”
아! 그도 경계인이었구나. 서른 무렵의 그를 정의하던 경계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 쫓겨난 난민, 괴로운 순례자였다면 칠순을 훌쩍 넘긴 그는 자신을 어떤 경계인으로 정의하고 있었을까 궁금했다. 아마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경계인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난 어떤 경계인일까?
돌이켜보면 나는 30대에는 중심에서 벗어나고픈 아웃사이더의 열망을 품은 경계인이었다. 그리고 40대에는 속해야 할 곳에 속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한숨을 품은 경계인이었고, 그리고 50이 넘어간 이제는 애초에 나에겐 돌아갈 곳이란 없었다라는 자각을 한 고향 없는 자로서의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고향 없는 자. 왠지 좀 쓸쓸하고 서글프다. 그래도 괜찮다. 고향 없는 자에겐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야 할 곳도 없다. 고향도 없고 타향도 없는 자에게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교토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돌아간 서경식 선생에게 한국인, 조선인, 일본인, 재일 동포 따위의 규정이 사족이듯 나에게도 한국인, 미국인, 재외동포, 외노자 따위의 규정이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평안을 꿈꾸듯, 나는 그저 그가 교토에서 평안했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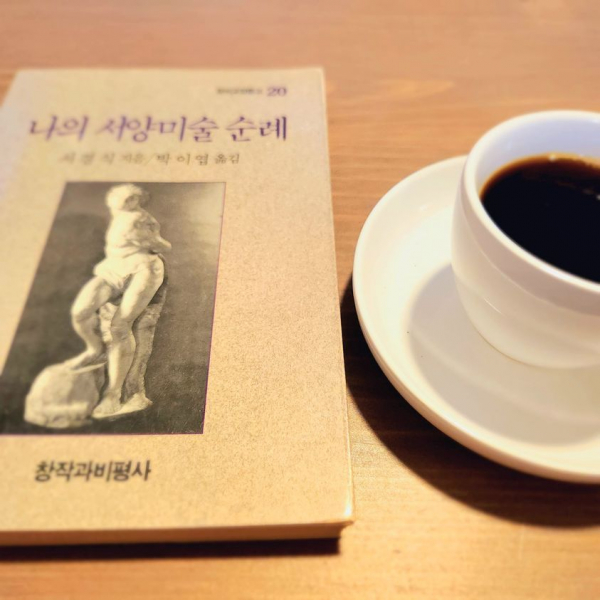
그에게 어울리는 커피가 뭐가 있을까 하다, 과테말라 게이샤를 꺼냈다. 사실 경계인이란 규정되기 어려운 정체성에 어울리는 커피를 아직은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커피 중 가장 좋은 커피를 꺼냈다. 고향 없는 자의 쌉쓰르함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의 자유로움이 모두 느껴지는 한 모금이길 바라면서 내 방식대로 내려 그를 추모했다. 그리고 나를 위로했다.
고향 없는 자로서의 경계인을 잘 표현한 시가 있다.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다. 시인 역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 일본 유학생, 해방 이후 조선 문학가 동맹에서 활동, 전향 후 보도연맹 가입, 납북 혹은 월북 등 그의 이력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죽음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월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다. 정X용이라니! 경계인은 이름 조차 탈취당한 그런 존재다.
고향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태희의 커피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grimmcoffeela.com 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매도 가능합니다.
